
PM, 군산 BA로드쇼서 챌린지 우승자 5명 수상
제주 사람들은 가장 아름다운 풍광을 가려 뽑아 ‘영주10경’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았다. 영주(瀛州)는 제주도의 옛 이름으로 중국 고대 설화에서 불로초가 자라는 곳을 말한다. 영주10경 중 첫 번째가 성산일출봉의 일출이고 두 번째는 제주국립박물관 뒤편의 사라봉에서 바라보는 일몰, ‘사봉낙조 (沙峰落照)’다.
어느 바다인들 일몰의 풍경이 없으랴마는 제주시 서부두를 지나 동중국해를 향해 넘어가는 사라봉의 낙조는 와인을 쏟아 놓은 것도 같고, 누군가가 저 바다 끝에다 불을 질러 놓은 것도 같다.
성산일출봉의 해돋이가 장엄하다면 사라봉의 일몰은 가슴을 저미는 애잔함이 있다.
늘 같은 풍경을 보고 사는 제주사람들도 수평선 아래로 해가 잠길 즈음에는 부지런히 걷던 걸음을 멈추고 서쪽 하늘을 바라본다. 어쩌면 그들의 가슴 속에는 매일 같이 바라보는 저 붉은 햇덩이 하나씩을 품고 있을 것도 같다. 한반도의 부속도서로 편입된 직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겪었던 수탈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이런 상상도 전혀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다. 
구두를 신고도 몇 걸음만 옮기면 도달하는 사라봉 꼭대기에 올라앉아 내려다보는 바다가 조금씩 조금씩 붉어지기 시작한다. 하늘이 붉어질수록 머릿속이 비워지고 가슴속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가 왈칵 치민다. 두 번 정도 만나 사랑에 빠져들기 시작할 때 느끼는 심정이거나, 헤어진 지 이틀 째 되어 이별이 실감나기 시작하는 무렵의 심정 같기도 하다.
문인수 시인은 자신의 작품 ‘서쪽이 없다’에서 노을을 바라볼 서쪽이라는 방향이 문명에 의해 차단 돼 있음을 ‘아름다운 여분이 없다’고 한탄했다. 서쪽이 있다는 것. 그것도 뻥 뚫린 여분을 수평과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은 분명 축복이다.
불콰한 일몰을 배경으로 귀항을 서두르는 통통배가 모호해진 하늘과 바다의 경계선을 다시 그으며 떠오고, 하루치의 비행을 마치고 둥지에 깃드는 새들. 그렇게 ‘개와 늑대의 시간’이 가까워진다. 개와 늑대의 시간이란 사냥을 나갔던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집 가까이에 보이는 짐승이 자신들이 기르던 개인지, 가축을 습격하려는 늑대인지 구분할 수 없는 시간을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온전히 해가 지고 어둠이 밀려오면 제주의 투명한 밤하늘에 떠오르는 무수한 빛이 별인지, 바다에다 생계를 의탁한 어부의 집어등인지 구별할 수 없는 시간이 된다.
아직도 먼 서쪽 하늘에는 채 사위지 않은 붉은 기운이 남아 마지막 잔을 들 듯 비장하다. 마지막 잔을 든다는 것은 술잔과 함께 출렁거리던 수만 가지 상념을 끝내 비워야 한다는 것이다.
호른처럼 낮게 글썽이는 고동소리를 남기고, 빈칸마다 환한 빛을 그려 넣은 여객선이 북태평양 항로를 따라 떠나가고, 간간이 뒤척이는 새들의 날갯짓 소리. 사라봉도, 사람도 그렇게 깊어간다.
벼르고 별러 ‘별도봉’
사라봉 길을 무심코 걷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별도봉으로 접어든다. 퉁쳐서 사라봉이라고 해도 좋으련만 야트막한 봉우리에 또다른 이름을 붙여놓았다.
화북포구를 지나 별도봉을 향해 가파르게 불어오는 바람소리에는 창칼을 벼리는 소리가 숨어 있는 듯하다. 비록 겨울 햇살에 마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꼿꼿하게 서걱이는 억새 숲에도 쇳소리가 섞여 있다. 별도봉의 옛 이름은 ‘베리오름’이다.
멀리로 부두를 떠나 유행가처럼 오가는 연락선과 고깃배가 출렁거리고, 만경창파 굽어보는 등대. 고개를 들면 다시 우뚝 솟은 한라산과 점강(漸降)하는 오름, 급기야 국립제주박물관의 독특한 지붕이 목전이다.
그 옛날 탐라의 군사들은 별도봉 인근에서 칼을 갈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 바닷가 오름은 ‘벼리다’에서 파생된 ‘베리’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왜구의 노략질이 잦았던 시절에는 별도봉 근처에 목책이나 쇳조각, 사금파리 등 갖가지 살상용 도구를 매설해놓고 봉우리 쪽으로 유인해 몰살시키곤 했다는 것이 작고하신 제주도의 이용상 시인의 전언이다.
별도봉은 뛰어난 풍광과 더할 나위 없는 산책로를 데이트 코스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행객들에게는 지나치기 쉬운 장소이다. 우선 입장료가 없는 까닭에 각종 관광안내도에 상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워낙에 다양하게 분포한 각종 명승지나 관광지와 제대로 견줄 기회조차도 잡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떤 사람들은 별도봉의 일출이 등을 맞댄 사라봉의 낙조에 버금가는 장관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성에서 밀리는 것은, 아무래도 낙조를 보는 일이 일출을 보는 것보다는 덜 부지런해도 되기 때문이 아닐까.
산이든 바다든 뛰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곳을 식별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곳에 ‘자살바위’가 존재하는가를 따져보는 것이다. 바다 쪽으로 유려하게 휘어지는 곡선을 따라 가다가 낙차 크게 꺾어지는 곳이 자살바위다.
生과 死는 이렇듯 하늘과 땅 차이다. 살아 있다는 것은 칼날처럼 날카로운 바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반대는 이제는 오를 수 없다는 것이다. 스스로를 살해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함을 산목숨으로 어찌 짐작할 수 있으랴.
다만 별도봉을 이루면서 피어나는 색색의 겨울 꽃들도 생사를 걸고 이 계절을 건너가고 있다는 것. 함부로 지녔던 모든 것들 다 놓아버리고 끝끝내 견디고 있다는 것.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PM, 군산 BA로드쇼서 챌린지 우승자 5명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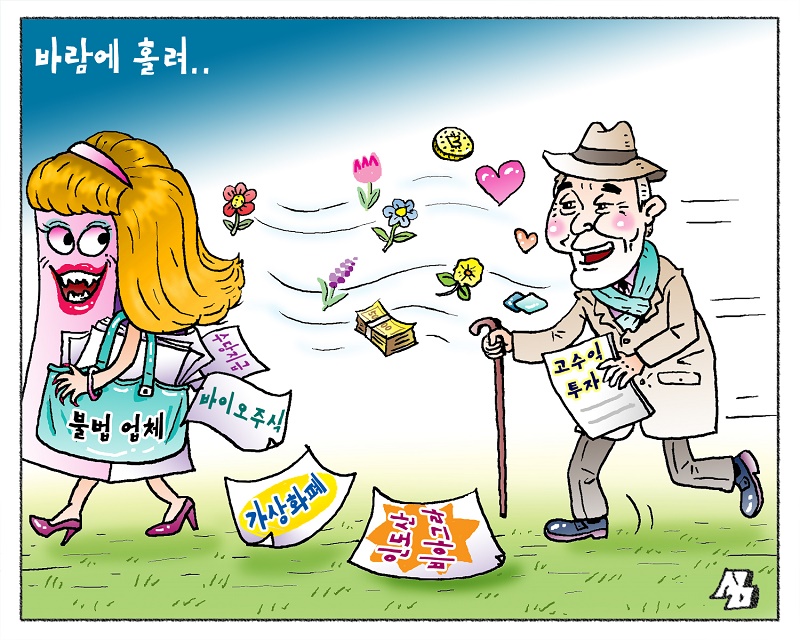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